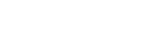기고문·인터뷰
-
- 등록자명
- 환경부
-
- 조회수
- 759
-
- 등록일자
- 2022-11-11
[문화일보 2022-11-11]
‘탄소 흡수원’ 습지 보전 힘 모을 때다
람사르협약은 1971년 2월 2일 동명의 이란 휴양지에서 채택됐다. 자연보전 분야에서 습지라는 단일 생태계에 중점을 둔 유일한 국제협약으로,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 공식 명칭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72개국이 가입했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전 지구적인 행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흙과 물이 어우러진 공간인 습지는 지구 표면적의 6%에 불과하지만, 세계 생물종의 약 40%가 사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다. 또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홍수와 가뭄 등 재해로부터 인류를 보호한다.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습지에서 생계를 유지한다.
습지에 의한 탄소 저장과 격리는 지구의 기후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전 세계 토지의 3%에 불과한 이탄습지(泥炭濕地)가 세계 산림의 2배에 이르는 탄소를 저장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국제 학계에서도, 연안 생태계에 고정된 탄소인 블루카본이 육상생태계에 흡수된 탄소와 총량은 비슷하지만 흡수 속도는 최대 50배 빠르다며, 차세대 탄소 감축원으로 연안 습지의 잠재적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습지는 식량안보, 재해 예방, 기후 조절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습지의 가치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2018년에 발간한 ‘지구 습지 전망’에 따르면, 1970∼2015년 중 전 세계 습지의 35%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에 비해 3배나 빠른 파괴 속도다. 습지에 의존하는 생물종의 25%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습지의 탄소 흡수 기능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은 습지 소실을 막기 위해 인류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 국제적으로 담수습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미생물에 의해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등 탄소 배출원으로 간주된다. 연안 생태계도 염습지, 맹그로브, 해초대처럼 식생이 분포하는 일부 갯벌만 블루카본으로 인정받는다. 식생이 없는 갯벌 등 더 많은 습지가 탄소 흡수원으로 증명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학적 당위성을 찾아야 한다. 뛰어난 탄소 흡수 능력을 지닌 해양생태계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우리 정부도 올해부터 5년간 습지 생태계의 탄소 배출과 흡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탄소 흡수를 증진하는 복원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새로운 블루카본을 발굴하고 탄소 흡수형 해안을 조성하기 위한 2단계 기술 개발(2022∼2026년)에도 돌입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약 2500㎢에 이르는 국내 갯벌이 연간 최대 46만t의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한다고 입증했다. 삼면이 바다이고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안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블루카본의 보고인 이유다.
나아가, 습지가 탄소 흡수원이 되려면 보전이 필수다. 이미 국제사회는 오는 2030년까지 전 지구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지지하고 있다. 마침 지난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사람과 자연을 위한 습지 보호’라는 구호 아래 협약 당사국들의 결집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감소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연 기반 해법으로 습지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진행 중이고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를 앞둔 지금, 국내 연구 성과와 국제 협력으로 머잖은 미래에 우리나라 습지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원문보기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1101032911000002